.gif) '습'에 이어서 '염'을 한다. 염에는 소렴과 대렴이 있다.
소렴(小殮)은 사망한 이튿날 아침에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서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한다. 습의에 이어 다른 의복들(正衣, 倒衣, 散衣 등)을 입히고 소렴포로 주검을 매거나 의복들을 새로 입히지 않고 소렴포로 싸기도 한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에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소렴상 위에 속포 20마를 일곱 구비로 서려 놓고 장포 7자를 길이로 깐다. 시신을 소렴상 위에 모신 후, 위아래 옷을 각각 겹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입힌다. 다음에 베개를 치우고 옷을 접어서 시신을 머리를 반듯하게 괴고 몸을 바르게 하는데, 햇솜으로 어깨 사이의 빈 곳을 채우고 좌우를 걷어 맨다. 양쪽 다리는 옷으로 보공(들어간 곳을 채우는 것)한 다음 발끝까지 똑바르게 한다.
수의는 왼쪽으로부터 여미되(좌임이라고 함, 대렴 때는 오른쪽으로부터 여미는데 이는 양과 음의 교차관계처럼 내세에서의 환생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임) 옷고름을 맬 때는 매듭을 주지 않고, 손은 악수로 싸맨다. 안은 검고 밖은 붉은 색으로 된 비단천으로 만든 명목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우고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의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은 다음 속포의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서부터 차례대로 묶어 올라간다. 그러므로 베 폭은 일곱 폭으로 묶고, 묶는 끈은 21개가 된다.
고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수의를 여자가 입히고 그 다음은 남자가 한다. 이것으로 소렴은 모두 끝 난다. 이렇게 소렴이 끝나면 한지로 고깔을 만들어 묶은 매듭마다 끼워 두기도 한다. 이 고깔은 저승의 열두 대문을 지날 때 문지기에게 씌워 주라는 뜻에서 넣는 것이다.
소렴이 끝난 후 시신을 시상에 모시고 곡을 한 다음 상제들은 머리 푼 것을 걷어올리고, 남자는 곡을 한다. 집사가 전을 올리는데, 이것이 고인에 대한 최후의 봉사이므로 상주와 근친 일동은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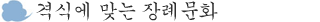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