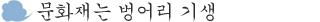소장하고 있는 고서화가 가짜로 판결 난다면......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박물관 등 공공 기관의 것이라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고, 개인의 소장품이라면 재산적 가치가 상실한다. 하지만 고서화처럼 가짜도 많고 또 감정이 까다로운 미술품도 드물다. 그것이 고서화의 진위를 감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고서화의 위작(僞作)들은 어떻게 생산될까?
첫째, 옛날에 서화를 배울 때면 과거의 명작품이나 스승의 작품을 그대로 모사하는 기간이 적어도 10년이나 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야 만 비로소 자기 화풍(畵風)이 나왔다. 상당수의 작품들이 서명이나 낙관 없이 전해 내려오는 점에서 화풍이 비슷한 작품이 작가 것이냐 아니면 제자의 것이냐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스승은 그림을 그리고 그 제자가 대신하여 화제를 쓰거나 서명하는 이른바 대필 풍습이 있었다. 신하가 왕을 대신하여 대필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그림과 서명자의 풍격(風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자에 화제가 되었던 변관식의 금강산 그림은 결국 밑그림과 글씨는 변관식이 쓰고 그림의 덧칠은 그 제자가 한 합작품으로 밝혀졌다.
셋째,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가짜를 만드는 경우와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얼큰한 기분이나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며 그린 그림들이 훗날 화풍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그림으로 둔갑되어 전해진다.
그렇다면 고서화는 어떤 기준으로 진위를 감정해야 하는가? 중국의 명감정가 장총옥(張蔥玉)은 주요 근거와 보조 근거로 나누어 작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근거란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시대적인 품격과 작가 개인의 품격이고, 보조 근거로는 인장, 종이의 질, 제발(題跋), 소장인, 감정인, 표구 방법 등이 있다. 먼저 시대 풍격은 서화는 작가에 의해 탄생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가가 산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한 명은 전쟁통에 활약한 작가이고, 다른 사람은 태평성대에 활약했다면 풍격이 당연히 다르다. 또 어떤 화파의 지속 여부도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그림 속의 도구들이(건축물, 복식, 소품 등) 시대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개인의 풍격은 작가의 출신지, 학식, 사상, 성격 등에 따라 작품의 품격이 달라지고, 또 유년과 말년에 따라 붓 놀림이나 작품의 구도가 변한다. 또 먹이나 채색 물감도 개인 특성이 강하다. 감정 안목이 높으면 붓을 놀린 속도와 붓끝의 강약까지 판별하여 진위를 감정한다고 한다.
보조 근거로 관제(款題)란 서화류에 기입된 제발, 성명, 호, 날짜, 당호, 화제 등을 말한다. 관제의 필적을 연구하여 누구의 작품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감정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림은 가짜인데 관제 때문에 진짜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 시대별로 각 소장가가 감상한 내용을 적어 놓거나 낙관을 찍어 논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참고 자료이다. 낙관은 작가의 것과 소장가의 것으로 구분되는데, 낙관 자체의 진위 판별도 중요하지만 인주의 성분이 시대에 따라 달랐던 것도 감정에 도움이 된다. 낙관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옛날에는 작가가 죽을 때에 그가 사용하던 인장을 순장품으로 묻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이 훗날 출토되어 나쁜 용도로 쓰였다. 또 그림을 그린 종이나 비단은 만들어진 시대 및 지역, 또는 재료 및 기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종이와 비단의 폭을 세심하게 재 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짠 비단 폭은 대개가 50여cm로 일정한데 그 이상 되는 그림이라면 분명히 두 개를 이었을 것이다. 그 잇댄 자국이 남아야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악덕 골동상이 가짜 그림을 이용해 어떻게 사기치는 가를 알아보자. A씨는 인사동에서 제법 감식안이 높고 재력도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다. 하루는 집에서 소장하던 단원의 그림을 팔려고 나갔다. 단원이란 글자도 한쪽에 선명하고, 그림의 품격도 별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었다. 하지만 단원 진품이란 확신은 평소에 없는 물건이다. 평소 안면이 있던 가게에 들여 그림을 내 놓았다. 골동상은 한 눈에 반갑게 맞이하였다. “여기 제발도 뚜렷하군요, 그렇지만 왠지 모사품같기도 합니다.” “허, 그래요.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서로 가격을 흥정한 끝에 결국 진품이 아닐 거라는 판단 아래 1천만 원에 거래되었다. “여기 양도서에 거래 가격을 1억 5천만 원으로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역시 팔아먹으려면….”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해하는 골동상을 보고 A씨는 ‘그래, 가격을 후하게 받았으니 너도 살아야지.’하는 심정으로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도장을 눌러 주었다.
그가 골동상의 파 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하루는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수갑을 채웠다. “이 사기꾼아, 가짜 그림을 1억 5천만 원에 팔아. 너같은 놈은….” 형사 취조 과정에 밝혀진 사실은 엄청난 음모였다. 그 골동상은 그림을 입수하고는 곧 고미술협회를 찾아갔다. 예상대로 ‘가짜’라는 확인서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시 친분 있던 교수를 찾아가 감정을 부탁하니 그 역시 ‘가짜’라는 감정서를 써 주었다. 올가미를 손에 쥔 그는 A씨의 목에 힘껏 감고는 잡아채었다. A씨만 억울하였다. “아닌데요. 사실은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써 준 양도서와 ‘가짜 감정서’가 눈앞에 펼쳐지자, A씨는 기겁을 하고 놀랐다. 하지만 증거가 뚜렷하니 모든 말들이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그림을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진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골동상이 1천만 원을 주기에 진품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 그림이 진품이라면 얼마나 가겠어요?” “글세, 2억원 가까이는 갈 겁니다.” “그럼, 가짜라면 얼마나 가겠어요?” “1~2만원….” “당신, 사기꾼 맞네. 설령 당신이 선의의 피해자라도 당신 말대로 가짜인 줄 알면서 1천원에 팔았으면 사기꾼이지. 당신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니 증거대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분명해. ” 아야 소리도 못하고 A씨는 사기꾼으로 몰려 철창 신세가 되었다. 감옥에서 나오려면 그가 인심 좋게 써 준 1억 5천만 원을 꼼짝없이 골동상에게 지불해야 했다. 증거가 명백하니 어쩔 수도 없었다. 재력 있고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금방 코를 베어 가는 세상이다.(참고: ①최준호의 「고서화의 감정」, ②「고서화 감정에 대한 고찰」․이건환․문화재사).
(사진: 불정대, 정선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