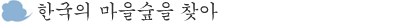[마을숲 이야기 16] 경북 영주 소수서원의 소나무숲
선비의 기조·기개 보여주는 듯 '기품'
조선시대 산림정책사를 연구하면서 머리 속에 떠나지 않는 물음을 하나 갖게 됐
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조선시대 산림정책은 곧 소나무정책(松政)이었다. 산림 관련 규
칙은 대부분 소나무 벌채를 금지하는 송금(禁松)이 목적이었으며, 마을 스스로가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규약 역시 금송계(禁松契) 형식을 띠었다. 이런 까닭에 다산 정약용
은 목민심서에서“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오직 송금 한 가지 조목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
했다. 우리 선조들은, 아니 최소한 당시 지배층은 소나무를 왜 그렇게 중요시했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그 만큼 소나무의 쓰임새가 많았다는 것이다. 숙종 때 조
선후기 대표적인 산림관리정책인 봉산제도를 신설하면서‘국가에는 큰 정책이 있는데 소나
무정책이 그 하나다. 위로는 궁궐의 건축자재를 대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활물자를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쓰임새가 지대하기 때문에 송금이 지극히 엄한 것이다’라고
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 배를 건조하고 궁궐을 짓고 관을 만드는
자재로 쓰일 목재가 소나무밖에 없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쓰임새의 장점과 함
께 소나무를 나무의 으뜸으로 인식한 유교적 관념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성리학을 숭상했던 사대부는 백두산을 여러 산 가운데 조종(祖宗)으로 여겼듯
이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를 나무의 으뜸으로 인식했다. 옛 선비들의 글
에서 자주 등장하는 ‘낙락장송’이나 ‘세한송(歲寒松)’은 선비들이 추구하는 삶을 소나
무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성리학을 국가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시
대 위정자들의 소나무 중시 관념성에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성과 목재
의 유용성이 더해져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소나무문화가 형성된 것
으로 여겨진다.
경북 영주 소수서원의 ‘소나무숲’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관념성이 투영된 숲이
다. 알려진 대로 소수서원은 신재 주세붕이 풍기군수를 역임할 때 고려 유학자인 회헌 안
향을 흠모하여 설립한 백운동서원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
서 임금께 서원의 합법적인 인정을 요구하였고, 명종이 이를 받아들여 손수 ‘소수서원’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는 旣廢之學 紹而修之에서 소수(紹修)라는 이름
을 따왔다)이라고 쓴 편액(扁額)을 하사함으로써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은 최초의 서원이
되었다. 이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도 살아남은 47개소 중 하나로, 현재 사적 제55
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 임금이 편액을 하사한 서원)인 소수서원의
숲만들기는 당연히 유교적 관념을 강하게 반영했다. 우선 서원 입구에 터잡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눈에 띤다. 소수서원이 걸어온 길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한 500여년 된 은행나무
는 공자의 학문을 추구하는 서원의 문패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회유와 시련
에도 변함없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절의 변화에도 변함없는 소나무를 심어 교육의 자
료로 활용하였다. 소수서원 입구에 2㏊ 남짓하게 자리잡은 ‘소나무숲’은 원생들이 오가
며 선비 정신을 깨닫도록 조성된 ‘선비나무’며 ‘학자나무’라 할 수 있다. 소나무 단순
림으로 조성된 이 숲은 수령이 100~500년에 이르는 노거수로, 서원의 왼쪽 언덕을 자연스
럽게 감싸고 있다. 요즘 학교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을 숲으로 바꾸려는 ‘학
교숲 만들기’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숲 그 자체가 배움의 터전이라는 진리
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국일보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