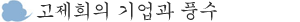효성그룹이 동양나일론을 창설해 섬유기업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시기는 1960년대 후반이었고, 당시 한국 경제는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로 인해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해 공급받던 시대였다.
효성의 창업주 조홍제 회장은 수입에 의존하던 물자 가운데 기간산업에 속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 생산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했다. 여기에는 조 회장만의 독특한 '신산법'(神算法)이 적용됐는데, 이는 손가락에 성냥개비를 끼우고 암산하는 방식의 계산법이다. 업무보고시 조 회장이 성냥개비만 꺼내 들면 경리과장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할 만큼 정확했다고 한다. 앞으로 공업이 발달하면 그 원료로 쓰이는 석유의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한 조 회장은 윤활유사업을 구상했다.
그 후 공장부지로 울산의 매암동 일대를 낙점했다. 주력공장의 입지조건은 왕왕 기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흔히 묘를 두고 명당을 운운하지만,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도 사업과 땅의 성격이 서로 궁합이 맞아야 지기(地氣)가 발동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당시 매암동의 시세는 주변에 비해 땅값이 비쌌다. 그렇지만 조 회장은 결단을 내려 10만여평의 땅을 매입했다. 울산공업단지 내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라 항만·전기·용수 등의 혜택이 크고, 인접한 정유공장에서 벙커C유의 공급이 용이하며, 대형 선박의 접안이 유리하다. 또한 부지의 기반이 튼튼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부지 매입이 추진되자 뜻하지 않게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야산은 묘들이 즐비해 매입이 어려웠고, 어떤 경우는 한 푼이라도 더 땅값을 높게 받으려고 콩밭이 하룻밤 사이에 과수원으로 변하는가 하면 어제까지 버려졌던 산비탈에 곡식이 심어지기도 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걸프사가 대만에 대단위 윤활유 공장을 건설한다는 정보가 날아 왔다.
조 회장은 윤활유사업을 깨끗이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치밀한 사업적 혜안으로 화학섬유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참으로 다행스런 변신으로, 울산공장이 들어선 매암동은 오래 전부터 나일론과 함께 대성할 기운이 점지된 곳이었다.
1960년대는 경제 성장과 함께 화학섬유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원사공장의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제직용 원사를 수입에 의존하던 때였다. 그래서 화섬산업은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모두 전망이 밝았다. 국내외 선발회사들도 시운전 기간으로 최소한 6개월을 허비하는데 동양나일론은 불과 10일로 시운전 기간을 앞당기며 세계 최고 품질의 나일론 원사를 생산했다.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분기한 낙동정맥은 동해안을 따라 울진의 백암산과 청송의 주왕산 그리고 부산의 금정산으로 이어지며, 단석산을 지난 정맥은 가지산에 이르러 동진하는 기맥을 출맥시켰다. 문수산까지 동진한 기맥은 태화강을 따라 동진을 계속한 뒤 신선산으로 솟아 기세를 가다듬었고, 재차 여천고개를 지나 동남방의 장생포까지 지맥을 뻗어 갔으며 울산만을 만나 지기를 응집했다.
따라서 매암동 터의 태조산은 태백산이고, 중조산이 단석산이고, 가지산이 소조산이며, 신선산이 주산이다. 그리고 신선산에서 북진과 동진을 거듭한 용맥이 바다를 향해 몸을 길게 누웠으니, 매암동의 터를 풍수는 '누운 용이 바다를 바라보는 와룡망해형(臥龍望海形)의 형국'으로 부른다.
그런데 누운 용이 머리를 들고 승천해 온갖 조화를 부리려면 반드시 여의주를 얻어야 한다. 만약 여의주를 얻지 못한다면 이무기로 남아 여의주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매암동은 근대에 들어 비로소 여의주를 얻었다.
무엇이 여의주일까. 바로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이 여의주다. 배들 이 바다에 떠다니니 용은 승천을 위해 여의주(배)를 입에 물고자 머리를 들고서 힘을 쓰고, 이 기운 때문에 산 기운이 발동해 발복을 가져온 것 이다.
와룡망해형은 예로부터 한 나라의 대관(大官)을 배출할 터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벼슬이 높은 관리는 화려한 관복을 입는데 이런 땅은 제왕의 아래에서 나라를 보필하는 충신처럼 의복보다는 옷을 짓는 데 쓰이는 실을 뽑기에 제격이고, 그 발복도 빠르다고 한다.
옛말에 한 집에서 정승이 세 명 나오면 명문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집도 대제학(大提學)이 한 명 나온 집보다는 못하고, 대제학이 세 명이라도 문묘배향(文廟配享) 한 명 나온 집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문묘배향이란 임금 재위 때 공이 많거나 덕망 높은 신하를 선발해 그 위패를 종묘에 모신 것으로 임금께 제사를 지낼 때면 그 신하에게도 제사를 지내 준다.
효성그룹은 21세기에 들어 어떤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전천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거목을 상징하는 심벌처럼 기업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창업이념을 담고서 이제 동양나일론이란 사명도 '효성T&C'로 변경했다.
여기서 프로 정신을 바탕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묘안을 제안한다. 풍수적으로 볼때 효성의 모기업인 울산공장의 지기를 한층 더 발동시켜 줘야 한다. 용은 머리에 두 개의 뿔이 있어야 성룡(成 龍)이고, 뿔이 없으면 힘이 약한 아룡(兒龍)이다. 다행이 공장 내에 대형 굴뚝이 설치돼 성룡이 됐다. 그러므로 용의 뿔에 해당하는 굴뚝을 용의 권위에 맞춰 좀더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이 풍운 속에서 온갖 재주를 부려 복을 줄 것이며, 나아가 신뢰와 공존공영의 한 축인 거래선과도 발전을 함께 이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