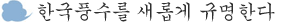|
풍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풍수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흔히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나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것이다. 전자는 물형론(物形論)으로 한국 풍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술법화된 것에 불과하다. 생기 충만한 터를 찾는 방법과 과정을 용, 사, 수에 맞추어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풍수학으로는, 형기론(形氣論)과 이기론(理氣論)이 있다. 후자는 형기론에서 쓰이는 풍수 용어이다.
먼저 물형론을 보자. 물형론은 어떤 장소의 주변 산천을 사람이나 짐승 혹은 새의 모양에 비유한다. 이것은 산천의 겉모양과 그 안의 정기는 서로 통한다는 전제를 두고, 보거나 잡을 수 없는 지기(地氣)를 구체적인 형상에 비유해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에 있는 황희 정승의 할아버지 묘를 두고 하는 말들이다. 이곳의 형상을 물형론에선 홍곡단풍형(紅谷丹楓形 : 붉은 골짜기에 단풍이 드는 형국)이라 한다.
그런데 모 출판사에서 나온 지명 안내서와 S씨는 커닝을 잘못하였는지 그만 '홍곡단풍형(鴻谷丹楓形 : 기러기 골짜기에 단풍이 드는 형국)'이라 하였다. 이를 두고 또 다른 풍수지리가 C씨는 '홍곡단풍형은 한문 어법상 문맥이 안 맞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풍수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라 주장하며, '기러기가 한가롭게 울며 날아가는데 한 줄기 바람에 바짝 긴장하며 몸을 약간 트는 형국[명홍조풍(鳴鴻遭風)]'이라고 전혀 다르게 말하였다. 그런데 단풍이 붉게 들든, 기러기에 단풍이 들든, 아니면 기러기가 날아가든 왜 그곳이 명당이 되는지는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설명은 빠져 있다.
현재의 제주 관사 부근은 지형이 개젖통 형국이어서 19대가 과거에 급제하고 24대에 걸쳐 태평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젖꼭지에 해당하는 터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풍수지리 집과 마을 - 김광언 저 대원사 간 1993 p68)]
이 역시 왜 개젖통 자리가 풍수 이론에 맞추어 명당이 되는지와 또 어떤 이유로 19대에 걸쳐 급제를 하고 24대에 걸쳐 태평을 누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명당에 대한 물형론의 설명은 대개가 이런 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또 한가지, 설령 물형을 똑같이 보았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생기가 응집된 혈을 달리 잡는다.
물형론에서 생기가 모인 혈은 힘을 쓴 곳이나, 긴장을 한 곳이나, 정신을 집중한 곳이라 한다. 그런데 그 혈의 정의가 애매 모호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부가 낚시를 드리운 물형이면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찌를 유심히 바라보기 때문에 찌의 자리가 혈이라 하기도 하고, 어부의 눈동자 부위가 혈이라 하기도 한다. 금계포란형의 물형에서도 사람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한다. 어떤 사람은 닭도 새이니 날개에 혈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알 자리가 명당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닭도 먹어야 사니 부리 부분에 생기가 모였다고 한다.
이렇듯 십인십색을 나타내는 데는 초목으로 뒤덮인 자연 속에서 기가 어디에 뭉쳤는지를 알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히 산천 형세를 물형으로 감별해 낼 수 있는 초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혈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은 풍수를 학문으로 대접하기보다는 그저 흥미거리로만 치부해 버린다. 최창조 역시 물형론이 득세하는 한국의 풍수 현실에서 한발치도 뛰어넘지 못했다. 그가 태안사의 터를 이론적 설명 없이 오직 물형론에 기대어 '비봉귀소형'으로 설명한 것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형기론은 산세의 모양이나 형세 상의 아름다움을 유추하여 혈이 맺혀 있는 터를 찾는 방법론이다. 임신한 여성은 보통 여성보다 배가 부르듯이, 산에 혈이 맺혀 있다면 분명히 다른 장소와 유별난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 특징을 이론화시키고, 산천 형세를 눈이나 감(感)으로 보아 이론에 꼭 맞는 장소를 찾아내면 된다. 형기론은 혈이 맺힐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방법이 간룡법(看龍法)과 장풍법(藏風法), 그리고 정혈법(定穴法)으로 나뉘어 계승· 발전되었다.
간룡법은 상하좌우로 힘차게 꿈틀거리며 뻗어나간 산줄기[용맥]을 찾고, 장풍법은 혈에 응집된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산봉우리가 감싸준 곳을 찾고, 정혈법은 혈이 응결된 장소적 특징을 세심하게 살펴 찾는 방법이다. 이 이론은 배산임수가 잘 된 마을이나 주택 등의 부지 선정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형기론은 '아기 못 낳는 여자가 밤마다 태몽 꿈을 꾼다.'는 격으로 양기(陽氣)인 물과 바람은 무시한 채 음기(陰氣)인 산의 형상만 보고 혈을 찾으니, 음양이 조화를 이룬 혈을 찾기란 실로 어렵다. 왜냐하면 여자도 남자를 만나야만 임신을 하듯이, 땅에 혈을 맺은 주체는 땅이 아니라 바람과 물이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라도 남자와 사랑을 나누어야 임신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젊은 여자라면 모두 임신했다고 오판하는 것이 형기론의 문제점이다. 그 결과 '용은 3년에 걸쳐 찾고, 혈은 10년에 걸쳐 찾는다'는 격언까지 생겼고 어떤 사람은 개안(開眼)이 되어야 혈을 찾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형기론으론 진혈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현재 한국 풍수의 이론은 정교한 형기론에 치우치나, 정작 이론에 맞는 혈을 현장에서 잡지 못하자, 최종적으론 물형론에 의지하여 혈을 짐작하는 수준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
이기론은 땅에 혈을 맺여놓은 주체인 양기(바람과 물)의 순환 궤도와 양을 패철로 살펴서 혈을 찾는 방법이다. 패철을 사용하니, 감(感)으로 혈을 찾는 다른 이론보다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다. 또 패철로 땅의 국(局)을 판단한 다음 산줄기와 물의 길흉을 판별해 혈을 정하니, 풍수 이론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물은 비단 자연의 물(구름· 지표수· 지하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적(靜的)인 땅을 기계적·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적(動的)인 양기의 총칭이다. 바람까지 포함한다.
우리는 지구가 365일만에 태양을 한바퀴씩 공전한다는 등의 천문에는 매우 밝다.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45억년에 걸쳐 형성된 땅의 형성과 지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없다. 땅은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동양의 대 학자들은 2천년 동안 지리를 연구하여 그 형성과 순환 원리를 패철이란 도구에 속속들이 담아 놓았다. 따라서 패철은 풍수학을 자연 현장에 투영시키는 도구로, 단순히 동서남북의 방위만 보는 나침반과는 크게 다른 물건이다. 최창조가 한때 이야기한 바대로["한국의 풍수사상" - p161] 패철은 풍수 정복의 최대 무기임이 틀림없다.
이기론은 당 나라의 양균송(楊筠松)이 말한 '가난을 구제하는 비법'으로, 아침 끼니를 굶던 집인데 낮에 좌향을 잘 잡아 장사를 지냈더니 저녁 무렵에 굴뚝에서 연기가 솟았다는 고사까지 전하며, 나라의 도읍지나 마을을 정하는 이론에 주로 쓰였다. 묘 터를 잡는 데에도 정확히 적중한 것으로 유명하다.
필자는 풍수이론의 여러 갈래 중에서 정통 풍수(이기론)를 가장 학문적인 이론으로 평가하며, 이 글도 이기론적 관점에서 최창조 풍수의 문제점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