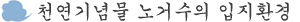본 연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에 국한하여 총 72건에 대해 입지 환경을 풍수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노거수들은 이곳 저곳에 원칙 없이 서 있어, 마치 운이 좋아 오래 산 나무처럼 보인다. 하지만 풍수학의 잣대로 관찰하면 어느 나무할 것 없이 풍수적으로 길지에 위치하며, 나아가 바람과 물의 영향도 좋게 받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즉, 노거수의 입지 환경이 풍수적으로 명당인 셈이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노거수에 대한 연구는 대개가 그들의 상징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거나 또는 총체적으로 보호 내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또 풍수학과 연관시켜 해석한 방법도 마을의 허한 부분을 비보(裨補)하거나, 수구(水口)막이나 수살맥이 등에 국한하여 부락이나 개인에게 위해한 요소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키 위해 심겨지고 가꾸어져 온 사실만을 다루고 있다. 물론 매서운 바람(북서풍, 바닷바람)이나 홍수의 피해를 막고, 마을 입지가 풍수적으로 허할 경우 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은 예는 여러 것들이 있다.
제29호인 '미조리의 상록수림'은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바닷바람으로 인한 지형적인 허를 보완키 위해 만든 방풍림이고, 제150호인 '물건의 방조어부림' 역시 300년 전에 바람과 해일을 막아 주는 숲을 바닷가를 따라 조성한 예이다. 사람들은 숲이 해를 입으면 동네가 망한다고 믿어 오랫동안 보호에 힘써 왔다.
또 제108호인 '함평 대동면의 줄나무'는 명륜당의 남쪽에 있는 수산봉이 화산(火山)인 까닭에 그 재앙을 막기 위해 풍수 사상에 따라 심어졌고, 제82호인 '무안 청천리의 줄나무'는 500년 전에 마을의 입지가 허하다는 풍수 사상에 따라 기를 보완키 위해 심었다고 전한다. 제154호인 '함양의 상림'은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무를 옮겨 심어 가꾼 호안림(護岸林)으로 유명하다. 위천이 함양읍의 가운데로 흐르자. 해마다 홍수의 피해가 컸다. 그러자 함양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은 주민을 동원해 둑을 쌓고 강물을 지금의 위치로 돌려 홍수를 막았다.
하지만 숱한 세월, 갖은 풍상을 이겨내고 굳굳히 서 있는 독립된 노거수의 입지 환경에 대해서는 근래까지 풍수학적 접근이 없었다. 그것은 조경계나 수목학계의 관계자들이 정통 풍수학에 관심이 덜했거나 또는 풍수학을 노거수의 입지 환경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보호와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측도 마찬가지이다. '거수목(巨樹木)은 나라의 보물이며, 우리의 기상이며. 겨레의 유산입니다. 이 값진 보물을 알뜰한 정성으로 가꾸고 또 보전하여 겨레의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줍시다.'라며, 홍보성 캠페인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조경학이나 수목학 내지 토양 지질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 사주팔자가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묘지를 전국적으로 찾아다녔고, 또 그런 연유로 풍수학에 관심을 두어 연구할 뿐이다. 따라서 연구의 성과를 논하기 앞서 답사하면서 느낀 아쉬움과 갈증을 먼저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다.
1)노거수의 입지 환경을 연구할 때면, 토양, 병충해, 생육 특성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야 종합적인 결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함께 할 전문가가 없었다. 따라서 입지 환경을 풍수적으로만 고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노거수에 대한 설화나 전설을 채록하는데, 마을 사람에게만 의존하였다. 자료 수집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연구 성과가 알차지 못했다.
3)시간 때문에 현장에서 자세한 관찰이 어려웠고, 비용 때문에 현장 자료(세부 사진, 토양 채취, 열매 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풍수학을 어떻게 하면 현대 학문에 접목시킬까 하는 오랜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것을 연구 성과로 꼽고 싶다.
1)노거수의 입지 환경은 풍수학 상, 용, 혈, 사, 수, 향에서 탁월한 길지이다. 따라서 이기 풍수학에 맞추어 수종별로 입지 환경을 분석, 종합하면 나무별로 오래 살 수 있는 입지 환경을 모델화 내지 도식화할 수 있다.
우리는 식목일을 전후해 대대적으로 나무 심는 행사를 벌리며, 또 건물 준공이나 귀빈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 식수'도 많이 한다. 하지만 비용에 들고 기념물인 나무가 곧 죽어 버린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과연 나무가 몇 년을 살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우선 수관 좋은 나무를 선정하고는 남이 많이 보는 장소를 택해 식목한다.
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입지 환경을 외면한 경관 위주의 조경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필자는 수종별로 어떤 입지 환경에서 나무가 천 년을 살 수 있는가를 풍수학적으로 도식화하였다. 따라서 토양뿐만 아니라. 양기의 흐름을 살펴 그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주어진 부지 내에서 생기가 최적으로 갈무리된 곳을 찾아 식목하고 또 주가지를 길향 방향으로 맞추어 주는 새로운 조경 모형이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나무가 고사하는 원인 중에서 용맥의 파괴로 나타난 경우를 풍수 이론에 맞추어 다시 고찰함으로써 노거수가 좀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관리, 보호 방안을 정립시킬 수 있었다.
노거수가 고사하는 주원인은 토양 환경이 변하거나 또는 태풍에 가지가 찢기거나 뿌리 채 뽑혀지는 것이다. 여기서 토양의 변화는 노거수가 입지한 터의 입수룡이 밭이 논으로 변하면서 땅 속에 물기가 많아지거나, 경작지의 확장에 따른 근원(根園)이 제약당하거나, 가옥등 생활 공간을 넓히기 위해 담이나 건물의 기초 공사를 벌이면서 나무뿌리를 절단하는 피해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풍수학적으로 보면, 토양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아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한 바람과 물의 흐름이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지질적 변화이다. 다시 설명하면, 땅은 스스로 지형이 바꾸거나 지질이 변화되지 못한다. 땅은 음(陰)으로 정적(靜的)이기 때문이다. 바로 땅 위로 흘러 다니는 양기가 어떤 방위에서 득수(得水)하여, 어떤 방위로 소수(消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으로 땅은 모양이나 뻗어 내린 방위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병오룡(丙午龍)의 경우, 12포태법을 적용하면 수국과 목국에서는 병룡과 절룡으로 생기를 품지 못한 흉룡이고, 화국과 금국에서는 장생룡과 임관룡에 해당하여 생기를 품은 길지이다. 그럼으로 어떤 노거수가 위치한 내룡이 병오룡이고, 수구는 화국의 신파(辛破)였다고 가정하면, 병오룡은 장생룡에 해당하여 땅 속은 견밀하고도 고운 입자로 이루어진 흙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수구에 도로나 아파트가 건설되어 유파(酉破)로 자연 흐름이 바뀌었다면 그곳은 목국이 된다. 그렇지만 병오룡은 변하지 못한 채 고정돼 있으니, 땅 속의 지질은 급작스럽게 절룡의 기운으로 변한다. 견밀하면서 고운 흙이 노거수가 필요로 하는 수분을 품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져 버린다. 백 번을 시험해도 틀림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3)보호수 중에서 향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사전에 선정하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준천연기념물'의 칭호을 부여하고,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시키면 좋겠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종은 지역과 고장에 따라 차별을 보이지만, 대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종과 일치한다.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소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등도 숫자가 상당하다. 따라서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입지 환경을 연구한 모식을 보호수에 적용시키면 어느 나무가 고사하지 않고 오래 살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천연기념물은 오래 산 것만이 지정 기준은 아니며, 학술적 가치나 진귀한 식물로 그 보존이 필요한 것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오래 산 나무는 희귀하고 또 역사나 전설이 자연스럽게 담김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다. 그같은 맥락에서 보호수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함양의 지곡면 개평리에는 함양군 보호수인 '처진 당송'이 있다. 그 마을은 조선 전기의 학자였던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선생의 고택(정병호 가옥, 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당송은 괘관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마을의 오른쪽을 감싸며 흐르는 경사진 비탈면에 자리잡고, 수령은 400∼500년으로 추정한다.
높이는 14.m이고, 5m 지점에서 서남쪽에서 Y자형으로 가지가 갈라지고, 가지의 끝은 땅에 닿을 정도로 처져 있다. 그래서 '처진 당송'이라 부른다. 소나무 아래에는 정병호 씨의 7대조인 청하공이 '종암(鍾巖)'이라 쓴 동그란 바위가 있고, 아래에는 우물이 있다. 풍수설에 의하면, 이 마을은 '배의 형국'이라 여러 곳에 우물을 팔 경우 배 밑바닥에 물이 솟는다 하여 현 소나무 아래의 공동 우물 외에는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다. 소나무를 배 돛의 형상으로 삼고자 풍수 사상에 따라 심었다고 전한다.
이 나무는 좌선수(左旋水)이고, 백호 자락 끝이 을파(乙破)이니 수국이다. 또 내룡은 신술 관대룡(辛戌冠帶龍)으로 입수하여 생기가 충만한 길지이다. 이 자리는 정왕향인 병좌임향(丙坐壬向, 북향)이거나 자왕향(自旺向)인 경좌갑향(庚坐甲向, 동향)이 정법이다. 가지가 처진 이유는 산비탈에 자리잡은 소나무가 무게중심을 잡거나 햇빛을 쫓으려고 가지를 남쪽으로 뻗었으나, 남방의 흉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고 꺾이어 처진 것이다.
즉, 가지가 처진 것은 남방이 흉하고 북향이 길한 결과이다. 가지의 길이도 서쪽이 10.1m, 남쪽이 8.2m으로 전체적으로 남방이 짧고 동북방이 길다. 함양 군청은 이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으려고 관련 자료를 문화재관리청에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탈락되었다고 한다. 입지 환경이 길지이고, 수세가 빼어나니 훗날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한 소나무라고 사료된다.
4)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 고사하여 해제된 나무의 입지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고사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 현재 지정된 나무의 보호, 관리에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고사(枯死)하여 지정이 해제된 노거수는 표에서 보듯 20여 건이고, 지역과 수종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는 수종 자체가 수명이 짧아 늙어 죽은 것도 있지만,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등이 고사한 원인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문화재이고 신목으로 신성시됨으로써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훼손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가지를 꺾으면 천벌을 받는다.'라는 등 무시무시한 경고가 전설로 전해지는 나무가 많고, 또 법에 의해 훼손은 처벌을 엄중히 받기 때문이다. 또 정부 간행의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을 살펴보아도, 해제 사유가 단순히 고사(말라죽음)로 나타나 마치 늙어서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토양 유실, 홍수 피해, 낙뇌(落雷), 태풍으로 인한 가지 찢김 등 자연적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제37호인 '진레면의 이팝나무'는 언덕 비탈에 서 있었으나 30년 전의 태풍으로 뿌리 채 뽑혀 고사하였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쉴 날이 없다.'라는 속담이 나무에 그대로 적용되니, 태풍만큼 위험한 재해도 없다.
그런데 풍수학에서는 나무로 불어오는 흉한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내는 뛰어난 논리 체계가 있다. 이른바 용상팔살(龍上八殺)로 산줄기가 뻗어 온 방위에 따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위가 패철 1층에 표시되어 있다. 남해의 느티나무나 속리의 정2품송은 모두 흉한 방위로 뻗은 가지가 부러진 것이다. 따라서 노거수마다 흉한 바람이 불어오는 방위로 뻗은 가지에 지주대나 버팀목 등으로 보강해 주면 가지 찢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제117호인 '청송의 향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제사용 향불을 위해 가지를 자르고, 도끼로 줄기를 찍어서 고사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현재 그 터에는 향나무 묘목을 다시 심었으나, 음식점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때문에 오래 살기는 그른 것으로 생각된다.
고사하여 지정이 해제된 노거수 중, 늙어서 죽은 나무로 추정되는 것들은 굴참나무, 밤나무, 뽕나무, 동매라 판단되고, 시냇가에 자라는 왕버들은 대개 경지 정리로 인해 수로가 변하여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의 제193호인 '청송 관동의 왕버들'은 냇가로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장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회화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등 소위 장수 수종은 대개 태풍으로 인한 피해나 혹은 나무 공동(空洞)에서 아이들의 불장난하여 화재피해를 있는 경우까지 있다.
5)현재 풍수학은 묘터를 잡는 방법에 많이 치우쳐 있으나, 노거수만은 대개가 평지에 자리잡고 있음으로 평야가 적은 한국 땅에서 좋은 집터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풍수적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었다.
나무가 한 자리에서 몇 백 년을 건강하게 살았다면 그 자리는 사람이 살더라도 좋은 터임이 분명할 것이다. 사람도 나무와 같이 땅과 바람의 기운에 의해 생명 활동을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노거수를 보면,
'나는 운 좋게 이 자리를 차지한 나무야. 사람들아, 이 자리가 바로 그대들이 찾는 명당 터가 아니겠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다. 자연 속에는 질서가 있고,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제자리에 잡고 살아감으로써 아름답게 저 엔트로피로 살 수 있다.
6)노거수의 수관과 가지의 뻗어 나감, 또 표피에 형성된 기하학적인 문양을 현대의 디자인 분야에 접목시키면 훌륭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럼으로 노거수는 디자이너와 예술가에게 창작에 필요한 새로운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늠름하게 버티고 서 있는 노거수는 자연이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든 생명의 예술품이다. 따라서 수형과 표피에 나타난 시간의 아름다움은 고려 청자처럼 보고 또 보아도 눈에 거슬리지 않은 순수한 미이다. 때깔을 보면, 파란 가을 하늘이 맑은 계곡 물에 어린 듯한 비취색이고, 형태를 보면 조롱박, 참외, 죽순 등 생활 주변의 자연 소재에서 따와 고향의 풋풋한 정감이 느껴진다. 또 문양은 청록색이 엷게 감도는 몸체에 보일 듯 말 듯한 신비한 상감 문양이 조화로와 바탕을 숨기지 않는 순수함에 약간의 파격을 준 자연과 호흡하는 미이다.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수령이 1,100년으로 추정되며,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이다.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품은 채 금강산에 입산하는 길에 심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세종대왕은 이 나무에 정3품의 당상관 벼슬을 하사하였다. 천 년의 풍상에 시달리고, 또한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며 울어서인지 나무의 밑동에는 어리고 서린 옹이가 큼직하게 매달려 있다.
바라보면 슬픔이 가슴 뭉클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슬픔의 소재를 찾는다면 그 옹이를 보면 된다. 자연의 장엄함을 찾고자 한다면, 제289호인 '묘산면의 소나무'이다. 이 나무는 1m 높이에서 가지가 갈라져 다시 아래로 처지듯이 발달했는데, 모습이 매우 독특하고 수려하며 바라보면 위압감이 느껴진다. 특히 나무 껍질이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가지가 용처럼 생겼다 하여 구룡목(龜龍木)이라 부른다.
7)수종에 적합한 길지를 찾아 '천 년을 살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럼으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고장의 나무로 지정한 지자체라면 상기 모델을 이용해 식목하면,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노거수로 자라나 지자체의 상징성을 높혀 줄 것이다.
현재 시·도를 비롯하여 각 군은 고장을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나무를 지정하여 보호에 힘쓰고 있다. 소위 '시 나무'·'군 나무'와 같은 것들로, 충북 괴산(槐山)의 나무는 느티나무이다.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신라 장수인 찬덕(讚德)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끝까지 싸울 것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식량과 물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목숨을 보전하길 원했다. 더 이상 싸움이 어렵자, 찬덕은 큰 느티나무에 머리를 들이박아 자결하였다. 충절을 높이 산 신라는 개잠성을 괴산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괴산에는 지금도 군 내 곳곳에 느티나무 거목이 즐비하다.
[사진 : 눈을 맞으면서 노거수를 촬영하는 고제희 선생.]
※ 출처(www.21fengshui.com) 명시 없이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위 글은 노거수 연구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