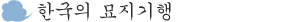|
구성면(駒城面) 마북리(麻北里)는 본래 언남리(彦南里)와 함께 용인 읍내였는데, 1938년 용인군청이 김량장리로 옮겨 간 뒤 구읍이 되었다. 마북리 시내의 중간 정도 쯤의 왼편에 ‘민영환 묘’라는 조그만 안내판이 있는데, 묘소로 가는 길은 겨우 차 한 대가 갈 수 있는 좁은 길로, 오른쪽 논에는 벼가 익어가고 있다. 입구에서 100여m를 가면 마을이 끝나는 낮은 산자락 밑에 한말의 정치가이며 애국지사였던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의 묘가 있다. 철문을 세운 빨간 벽돌 기둥의 오른쪽에는 ‘桂庭 閔忠正公墓’라는 글씨가 하얀 화강암에 음각되어 있고, 그 앞에는 아낙네들이 돗자리에 빨간 고추를 가위로 썰며 말리고 있었다. 산등성에 보이는 묘역의 푸르름을 배경으로 빨간 고추를 보니, 불현듯 일본에게 유린당한 조국을 죽음으로 구하고자 순결한 충정공의 핏빛을 보는 듯하여 섬뜩하였다.
충정공(忠正公) 민영환 선생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본관은 여흥(驪興)이며, 자는 문약(文若), 호는 계정(桂庭)으로, 1861년(철종 12년) 호조 판서를 지낸 겸호(謙鎬)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878년 문과의 병과(丙科)에 급제한 뒤 홍문관의 정자(正字)․검열 등을 역임하였고, 1882년에는 성균관 대사성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그해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 그의 부친이 살해되자 관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1884년 충정공은 이조 참의로 재임명되고, 1890년에는 병조 판서, 1893년에는 형조 판서․한성 부윤을 역임하였다. 1894년 일본은 조선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승리하자 청의 요동 반도를 점령하려는 수작을 부렸다. 그러나 삼국의 간섭으로 일본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풀이라도 하듯 1895년에는 명성황후(明成皇后)을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자 충정공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충정공은 충성과 외교적 재능이 뛰어나, 1896년에 있었던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고, 이어 윤치호(尹致昊)․김득련(金得鍊)․김도일(金道一)과 함께 인천을 떠나 상해․나가사키(長崎)․동경․캐나다․뉴욕․런던․폴란드 및 독일을 경유하여 모스코바에 이르는 대장정의 세계 일주를 조선인으로써는 처음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유와 경험으로 충정공은 그 후 영국 여왕의 60년 축하식에도 참석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여행을 하였고, 이 때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구미 지역의 발전된 문물과 근대화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제국주의 열강의 발전된 산업 문명을 직접 체험한 충정공은 도탄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독립협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정의 개혁을 주도하였고, 어용 단체인 황국협회(皇國協會) 등의 친일파 각료들과 일일이 대립하며 일본의 내정 간섭을 성토하였다. 이러한 충정공의 활동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조정을 움직여 충정공을 한직인 시종무관으로 좌천시켰고, 충정공은 그럴수록 더욱 강력히 일본의 음모를 분쇄하려 하였다. 특히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음모를 예견하고, 한규설(韓圭卨)을 총리대신으로 추대하여 그를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5년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기 위한 첫 단계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한다는 등의 5개 조문을 헌병을 동원하는 등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체결을 강요하였고, 이 때 조선의 조정은 여덟 대신 중 다섯 대신의 찬성을 얻어 굴욕적인 조약을 그 해 11월에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며,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제적으로 자주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다. 이 때 이 조약에 찬성한 다섯 대신을 우리는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그리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이며, 외부대신 박제순이 이들의 찬성을 얻어 일본의 하야시곤스케(林權助) 공사와 이 조약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 조약의 불평등과 부당함에 분노한 충정공은 전임 의정대신이었던 조병세(趙秉世)를 소두(疎頭)로 백관들과 연계하여 연이여 소(疎)를 올려 이 조약의 파기와 찬동한 오적의 처형을 요구하였는데, 이 상소에 대한 임금의 답변〔批答〕도 있기 전에 조병세는 일본 헌병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그러자 충정공은 이에 물러나지 않고 자신을 소두(疎頭)로 하여 두 차례나 다시 상소를 올렸고, 그 상소가 관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에서 물러나지 않자, 이에 당황한 일본은 조정을 협박하여 선생을 왕명을 거역한 죄로 구속하였다. 가까스로 풀려난 충정공은 또 다시 뜻을 같이한 사람들과 종로의 육주비전에 모여 소청을 설치하고 계속 항쟁할 것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충정공은 이미 국운이 기울어져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전동(典洞)의 이완식(李完植)의 집으로 가서 국민의 각성과 외국 사절과 황제에게 고한 유서(遺書) 3통을 쓰고 자결하였다. 충정공의 자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임대신 조병세를 비롯하여 전 참판 홍만식(洪萬植)․학부주사 이상철(李相喆)․김봉학(金奉學) 등 많은 인사들이 줄이어 목숨을 끊었고, 충정공의 인력거(人力車)꾼도 자결하였다. 사후에 충정공의 애국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그에게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대신에 추증하고 의절의 정문을 세웠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국민장에 추서되었으며, 동상도 비원 앞에 세워졌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충정공의 유택
침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누며 잔디를 따라 충정공의 산소 앞에 서니 파란 잔디 속에서 패랭이꽃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묘 오른쪽에 있는 비석에는 ‘桂庭閔忠正公泳煥之墓’라는 비문이 선명히 음각되어 있고 묘는 자좌오향(子座午向)으로 구성 읍내를 바라보며 시원스레 자리잡았다. 옛말에 정승이 한 집안에서 3명이 나오면 명문가라고 하지만, 이는 대제학(大提學) 한 명이 나온 집안보다는 못하고, 대제학 3명 나온 가문은 더 없이 휼륭하지만, 그래도 문묘배향(文廟配享) 1명 나온 가문에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문묘배향이란 조선의 27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곳에 당대 임금 재위 때에 공이 많거나 덕망이 높은 신하를 골라 그 위패를 임금과 함께 모신 것으로, 먼저 임금께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그 신하에게 제사를 지낸다. 충정공은 고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충정공의 시와 대나무
충정공이 남긴 유고로는 ꡐ해천주법(海天秋帆)ꡑ․‘천일책(千一策)’ 등 많은 소(疏)가 있으며, 특히 유필(遺筆)로 남긴 한 폭의 한시는 충정공의 애국 애민 사상이 점점이 깃들어 있는데, 이 오언절구의 시는 충정공이 직접 쓰고 끝에는 서명 대신 호를 썼다.
거처를 사랑하며 세상 일이 편안하기를 희망하고 (愛居希道泰)
나라를 걱정하니 해마다 풍년 들기를 원하노라 (憂國願年豊)
어찌하면 베개 아래에서 샘물을 얻고 (安得枕下泉)
이를 비로 만들어 인간 세상에 보낼까나. (去作人間雨)
전해오는 일화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충정공은 희나뭇골의 청지기 집에서 조그만 칼로 목을 난자하여 자결하였는데, 이 때 큰 별이 서쪽에서 떨어지고, 까마귀와 까치가 떼를 지어 울었다 한다. 또한 그 곳에 있던 충정공의 피묻은 옷과 칼을 가져다가 전동(典洞)에 있는 충정공 집 마루방에 두었는데, 그 다음해 5월 방을 열어 보니, 대나무 4그루가 마루방 틈에서 피묻은 옷을 뚫고 솟아 나왔으며, 잎이 푸르고 생기가 넘치었다 한다. 이것을 보기 위하여 구경꾼들이 몰려 들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충정공의 충절이 혈죽(血竹)으로 변하여 생겼다 하여 시와 노래로 찬탄하였다 한다.
|